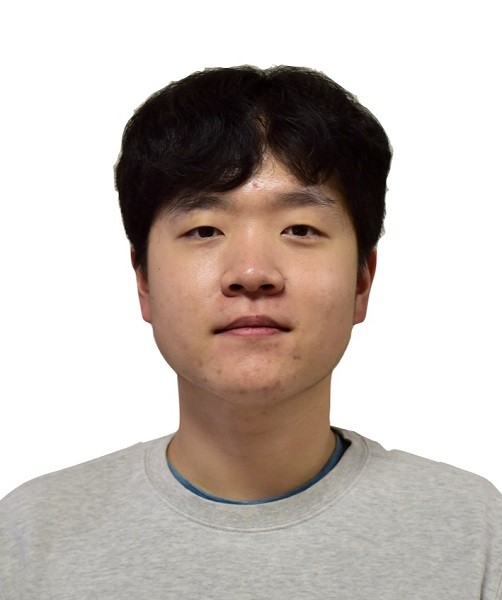‘채널PNU' 기자증이 생긴 후 나는 카메라를 마우스만큼이나 자주 잡았다. 비록 채널PNU엔 아직 사진부가 없지만, 사진을 나름 찍는다는 이유로 취재기자 겸 비공식 사진기자가 됐다. 직접 해 보니 사진기자도 취재 기자만큼이나 현장에 갈 일이 많았다. ‘현장에 가면 편집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기자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한 번쯤 들어 본 말일 것이다. 나는 지난 한 학기 동안 내가 쓴 기사의 취재 현장에 더해 동료 기자들의 현장까지 챙기며 그 말의 신봉자가 되었다.
‘편집국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분위기’라는 말이 그나마 가까울 것 같다. 지난 봄, 6.1. 전국지방선거 취재차 세 정당의 선거캠프를 방문했는데, 선거일 D-Day를 붙여 놓고 모두가 들떠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서면 답변서만으론 느낄 수 없는 분위기를 느꼈다. 시험 일주일 전의 도서관과 비슷하지만 훨씬 역동적이었다. 그런 분위기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보며 “우리 후보님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캠프 구성원을 만난 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나니 질문지를 쓸 때 생각지 못한 따끈따끈한 질문을 상대에게 던지게 됐다.
방학 중에 취재차 방문한 센텀시티의 초고층 빌딩의 한 스타트업 회사에서는 자유롭고 유연한 분위기를 느꼈다. 자유로운 복장을 한 직원들의 표정에선 위계서열에 짓눌린 긴장감 같은 건 없었다. 뭔가 ‘혁신적인 것’이 있을 것만 같았다. 두리번거리며 사무실을 둘러보다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전망 좋은 공간은 회의실이나 중역실이 되기 마련인데 1인실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물어보니 ‘원격 회의실’이란 답이 돌아왔다. 해당 회사는 부산과 서울에 인력이 분산돼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원격회의를 열어 왔다고 했다. 더불어 순환근무, 재택근무, 페이퍼리스 업무까지 여러 면에서 진일보해 있었는데 그 덕분에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로의 전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여느 회사와 달리 해당 회사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분명 기사를 쓰기에 ‘그림이 되는’ 이야기지만, 질문지에도 없었고 직원들 역시 일언반구 언급도 없던 이야기다.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전혀 알지 못했을 이야기인 것이다. 나는 당초 초고층 빌딩 이야기로 시작하려 했던 기사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
지금은 조금 논란이 있지만, 한때 한국 언론사의 전설적인 기자로 손꼽혔던 조갑제 씨는 뛰어난 눈썰미를 바탕으로 한 현장 취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기자실을 벗어나 쓰레기통을 뒤져 파쇄 종이를 이어 맞추거나, 5.18에는 병가를 내고 광주에 잠입 취재를 감행하는 등 여러 면에서 열정적인 취재로 특종을 찍어냈다. 당시에 비하면 요즘 기자의 밥벌이는 힘들지만, 취재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다. 기자실이 전부이던 과거와 비교하면 기자들이 인터넷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홍수와도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터넷은 정보의 소스는 될 수 있을지언정, 기사의 화룡점정은 현장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던 한 기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현장 방문으로 진화한 취재 질문과 기사를 생각하며, 현장의 중요성을 절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