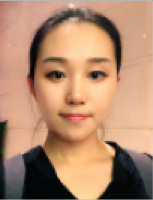이 글을 쓰겠다고 노트북을 열어서 한글을 켠 지 2시간째다. 막연히 무엇에 대해서 써야겠다고 주제를 생각했지만 구체화된 생각이 아니어서 그런지 10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내가 무엇에 대해서 쓰고자 했는지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글쓰기란 그런가보다, 나의 생각이 짧으면 절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
사실 최근에 글을 쓸 일이 거의 없었다. 마지막으로 쓴 긴 글이 개인 SNS에 썼던 합격 수기. 한마디로 약 8개월 전에 쓰고, 그 이후 내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허투루 살아온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풀어쓸 만한 생각이 없는 걸까.
열심히 살았다고는 하지만 깊이 생각할 기회가 없었던 탓이 아닐까. 예전에는 심심하면 가만히 혼자 앉아서는 하루 또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나의 행동을, 생각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되짚어나갔다. ‘그때 이렇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와 같은 성찰은 나를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의 틈이 생기면 바로 핸드폰을 집어 든다. 불과 1분 전에 집어 들었던 폰이기에 새로운 알림이 없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끊임없이 폰을 집어 들고 화면을 터치하면서 관심 없는 일도 관심이 있었던 마냥 열심히 읽고, ‘1’이 없는 SNS를 하염없이 기다린다.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고 싶은 것이 생길 때 잠시 몇 분 집중해서 보다가 질린 나머지 다시 폰을 내려놓는다. 인터넷이 나에게 생각할 주제를 주지 않으면 머릿속이 공허해진, 폰의 노예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사고를 개척하는 ‘나’는 온데간데 없고, 동물에게 주는 먹이마냥 미끼를 던져주어야 비로소 머릿속을 굴려대는 ‘나’만 남아있을 뿐이다.
폰과 인터넷은 나의 사고를 획일화하기까지 하는 모양이다. SNS에 뜨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들, 그중에는 분명 나와 다른 사람들이 더 많기 마련이다. 내 삶의 모습을 찾아 나가고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무색하게 타인의 사진들과 마케팅들을 보면 줏대라곤 찾아볼 수 없이 흔들린다. 분명히 답이 많은 문제인데 내 답이 오답처럼 느껴져서 혼란을 느낀다. 한 쪽 마음에서는 내 모습을 지켜보자고 SNS를 끊자고 매일같이 다짐하지만 어디 쉬운 일인가.
언젠가부터 친구를 만나도 어느 순간 서로 폰을 보고 있고, SNS에서 본 일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내가 겪은 일,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한 내용은 없다. 소소한 일보다 충격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나의 삶의 곳곳에 나의 흔적은 없어지고 인터넷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글을 쓰며 스스로 다짐해본다. 폰을 내려놓고 주변인들과 대화하고 모든 일을 사유하면서 생각의 나래를 펼쳐보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의 가치관을 다시 생각해 보자고, 폰이 없어도, 정보가 조금 부족해도 사는 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나를 다독여본다. 그런데 이 글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끝나간다는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든다. 가야 할 길이 참 멀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