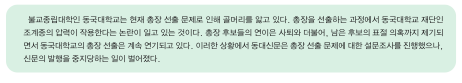
선배가 말했다. 그곳(동대신문사)에서 3년을 보낸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였다고. 동료 기자들과의 의견 마찰, 대학본부와의 공방…. 그 모든 충돌들이 공부였다고. 그래서 ‘동대신문’은 그에게 ‘대학 그 자체’였다고.
그런 동대신문이 65년 역사상 처음으로 ‘발행 중지’를 당했다. 유신, 5공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심지어 이런 전근대적 사태가 신문방송학과 교수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동국대는 지금, 총장 선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교 종립대학인 동국대는 총장 선출 시기마다 알게 모르게 재단인 조계종의 입김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한 총장 후보가 조계종 고위 스님 5인과 회동한 뒤 사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또 다른 후보가 ‘조계종은 총장 선거에 개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퇴하면서 더욱 커졌다. 남은 단 한명의 총장 후보조차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이런 논란 속에서 총장 선출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신문이 속한 ‘동국미디어센터’의 센터장 김 모 교수는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인 모 총장 후보의 지지자였다. 학생 기자들이 총장 선출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을 때, 김 교수는 ‘민감한 사안이니 보도의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보도에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며 신문 제작에 심하게 간섭했다. 학생 기자들이 편집자율권을 강조하며 맞섰지만, 그때마다 ‘팩트가 중요하다’, ‘무조건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본질을 비껴갔다.
이런 맥락에서 김 교수가 발행을 중단시켰다. 우리가 쓴 기사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사 내용이 한쪽에 치우쳐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이를 명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일방적으로 발행 중지를 선언하고 자리를 떴다. 인쇄되지 못한 동대신문 1561호(3월 23일 자)에는 총장 선출을 비롯한 현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가 담겨있었다. 그리고 이 설문 결과는 김 교수가 지지하는 총장 후보에 대해 다소 불리한 결과를 보여줬다.
신문이 발행됐어야 하는 23일, 우리는 대자보를 붙였다. 보도자료도 만들어 각 언론사와 학보사에 배포했다. ‘언론 탄압을 자행한 김 교수는 미디어센터장 보직을 사퇴하라’고, ‘학생 기자들의 편집 자율권을 보장하라’고, ‘동대신문의 발행을 정상화해달라’고.
김 교수는 결국 보직을 사퇴했다. 학교 당국은 우리에게 김 교수의 보직 사퇴를 받아들이고 신문 발행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신문 1561호는 본 발행일보다 3일 뒤인 26일 발행·배포됐다. ‘동대신문 발행 중지’는 결국 ‘발행 중지 시도’에 그쳤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민주 사회의 기본권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억압이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또는 이보다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현 사안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다소 진부한 말일지 모르나,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서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논쟁하고 협의하면 된다. 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특정인을 지지하는 센터장의 의견도, 우리의 대자보를 찢는 이들의 의견도 용인할 수 있다. 다만 ‘당신은 틀렸으므로 말할 수 없다’는 이들에게 저항했을 뿐이다.
기자들의 보도 내용이 틀렸을 수 있다. 편향됐을 수 있다. 비난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토론하면 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된다. 이는 절대 ‘말할 수 없다’며 신문 발행을 중지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승현(동국대학교 동대신문 편집장)
press@pu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