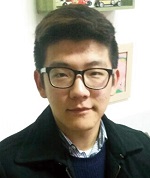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소음과 멀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오랫동안 밤을 밝히는 빌딩의 빛마저 자취를 감추는 고요한 새벽에도 어디선가 자동차의 경적이나 기차가 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면 잠시 소음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잠시 정신이 흐트러진 틈을 타 귓속을 파고든다. 소음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딱히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면 다른 소리로 귀를 덮어버리고 일에 집중하기도 한다. 그것이 평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기도 하다.
소음에 지친 사람들은 혹사당한 귀가 쉴 수 있도록 조용한 곳을 찾아 떠난다. 문명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깊은 숲 속이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한적한 카페를 찾아간다. 멀리 떠날 시간이 없으면 모두 점심을 먹으로 나간 사무실 같은 곳에서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런 휴식을 통해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곳이 참으로 조용한 곳이라 말할 수 있을까. 듣기 싫은 소음으로부터 해방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귀의 휴식을 위해 선택한 장소가 소리로부터 완벽히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고른 장소가 숲이라면 필히 새나 벌레가 우는 소리 또는 젖은 머리를 털어내듯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카페라면 손님이 자신 한 명뿐이라 해도 자연의 소리를 대신해서 귀에 자극을 줄 물건이 가득하다. 텅 빈 사무실도 마찬가지이다. 안은 그나마 조용하겠지만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소리가 흘러들어 온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다고 쳐도 본인이 의자에 앉으면서 삐걱대는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흥얼거려 방 안을 소리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 소리는 우리 주위에서 공기 마냥 떠다니고 있다.
모든 소리가 귀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서 소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만약 조용한 곳을 찾아간다면 아무런 소리가 없다는 사전적 의미의 장소 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시끄러운 곳으로 간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귀에게는 상당히 애석한 일이다.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자극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말년에 가면 청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못을 두드린 망치가 망가지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혹자는 청각에 문제가 생기면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거대한 파도 같은 소리의 손길을 피해 살아간다는 것은 몹시 어려운 일이다. 일상적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명이 들리는 경우가 빈번하다. 비록 그것이 환청과 비슷한 세상에 없는 소리라고 해도 귀를 자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태어날 때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함부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어디까지나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듣지 못 할 뿐이다. 그들도 어떤 소리 속에서 휩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해 보았을 때, 덜 시끄러운 것은 몰라도 진짜 조용함을 느낄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잠시 어떤 일에 집중하여 소리를 잊거나 다른 소리로 덮어버리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이자 최선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조용한 장소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곳이며, 어쩌면 소리라는 것은 자신의 육체가 한 줌의 재가 될 때까지 짊어져야할 인간의 업보 중 하나이지 않을까.
안호진(노어노문 1)
press@pu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