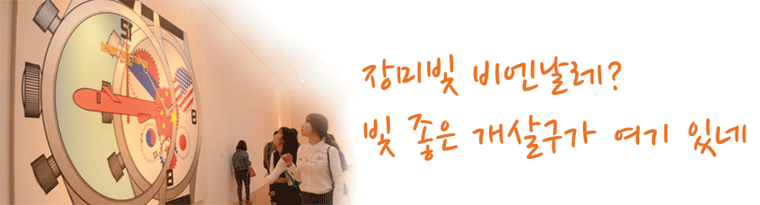
격년제로 진행되는 미술제인 비엔날레. 국내의 경우 10여 개로 추산되지만, 비엔날레라는 이름은 붙지 않았으나 유사한 형태의 ‘미술제’나 ‘미디어 아트’ 등을 합하면 20여 개에 육박한다. 전 세계적으로 비엔날레가 200여 개 정도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너무 많은 숫자다. 하지만 정작 이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행사도 한둘이 아닌데다, 대다수 비엔날레의 수준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실망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국고 보조를 받지만 국민들에게는 그저 ‘다른 세상 이야기’로 치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맹이 없는 잔치 천국
2014 짝수년, ‘비엔날레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은 비엔날 레로 가득하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비엔날레에는 △부산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대구사진비엔날레 △창원조각비엔날레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곧 개막할 △대전비엔날레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등 다른 행사까지 합하면 국내에서는 연중 비엔날레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이렇게 비엔날레 수가 많지만 모두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자체에서 지역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판을 벌여놨으나 신통치 않은 결과에 실망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거나 존재감이 없어진 행사도 적지 않다. 2000년대 중반 개막해 2010년에 사라진 인천여성비엔날레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행사는 3만 명 안팎의 관람객을 모으다 국비지원이 끊긴 직후 자취를 감췄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많은 행사에 우려를 표했다. 반이정 미술평론가는 “근 20년 사이에 비엔날레가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했지만 질적인 발전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진행되는 비엔날레들에서는 미술인과 비미술인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과포화상태인 비엔날레는 △운영 미숙 △입장객 부풀리기 △작품의 질 저하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 2012년 대구광역시는 대구사진비엔날레의 관람객 수를 30%나 부풀려 보고했다가 시의회에 의해 발각당하고, 경기도는 경기도자비엔날레에 지역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기도 했다. 지역 마케팅을 위해 지자체 장들이 무리하게 행사를 주도하고 산하 재단이나 조직위원회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또한 문제다.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국내 비엔날레는 뚜렷한 목적성과 지향점 없이 관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도시 마케팅을 위해 비엔날레를 하는 것이라면 각 지역에 걸맞은 예술 행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부산비엔날레는
지난달 20일에는‘ 2014부산비엔날레’가 개막했다. 올해의 주제는 ‘세상 속에 거주하기’로, 총 30개국 160여 명의 작가들이 작품 484점을 선보였다. 본 전시와 2개의 특별전, 학술행사와 국제교류행사 등 여러 가지를 준비했으나 관객과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했다. 부산비엔날레 역시 여타 비엔날레들이 가진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부산비엔날레는 시작 전부터 삐걱거렸다. 전시감독 선임 외압 논란을 빚은 오광수 전 운영위원장이 지역 미술인들의 보이콧 운동에 중도 사퇴하고, 결국 직무대행 체제로 변경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은 했으나 관객들은 뚜껑을 열어보니 실망감만 더욱 커졌다는 의견이었다.
본 전시가 열리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운동 △우주와 하늘 △정체성 △동물과의 대화 △역사와 전쟁 등 7개의 소주제 전시가 진행됐다. 하지만 작품의 질이 관객들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개막 전부터 논란 속에 선임된 프랑스 출신 전시 감독이 편파적으로 작품을 선정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관람객 유성현(좌동, 39) 씨는 “전반적으로 프랑스 국적 작가의 작품이 많아 의문스러웠다”며 “더 신선하고 유망한 작가들의 작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막 전부터 있었던 논란이 결국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비엔날레 참여 작가 77명 중 26명이 올리비에 캐플랑 전시 감독과 국적이 같은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비엔날레 특유의 실험성과 비전이 부족했다는 평도 있었다. 전시장을 찾은 동아대학교 미술학과의 한 교수는 “원래 비엔날레란 ‘현대미술의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진취적이고 대담한 것인데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소위 ‘잘 나가는’ 작가들의 작품들이 모였다는 느낌밖에 들지 않는다”며“ 특별히 참신하거나 인상적인 작품이 없어 관객들의 시선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본 전시 외에 특별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그는 “부산문화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별전 역시 ‘한국현대미술비엔날레진출사 50년’이라는 타이틀과

맞지 않게 전시작들이 부산비엔날레와 연관이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미숙한 운영 역시 관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이은미(재송동, 45) 씨는“ 매회 부산비엔날레를 찾는데 올해는 특히 관람 동선이 어지럽고 작품 설명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해가 거듭할수록 일반 시민들은 즐기지 못하는 ‘그들만의 잔치’가 돼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