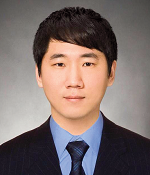
올해 들어 유난히 나라 안이 부산하다.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잇따른 인재(人災)에 사회는 불안에 떨고 있다. 그 누가 못다 핀 어린 꽃들을 차가운 해저로 내몰았는가에 대한 책임공방이 진행되고 있고, 급기야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안전행정부’로의 개명을 통한 안전사고 척결을 천명했던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나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볼 때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동안 ‘멀쩡히’ 항해해 온 이 거대한 ‘배’에 균열이 일어나고, 승객들은 더없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고백할 것이 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때부터 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금까지 17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공공장소에서 대피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아마 내 나이 또래의 청년들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한다. 지하철, 병원, 기차 등에서는 화재가 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짐작도 할 수 없다. 겨우 생각나는 거라곤, 영화상영 시작 전 영화관에서의 대피요령에 대해 설명하는 이름 모를 아가씨의 목소리 정도랄까. 침착한 상태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급박한 재난이 닥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하고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보통 큰일이 아니다. 심지어 인재(人災)의 최고 수준인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으로서도 부끄럽지만 전쟁 발발 시 행동 요령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정말 내 국민성이 미개한 탓일까?
재난 대응에 관해서는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보면, 장비와 전문인력도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바로 “Drill”이다.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들을 그들은 매년 정해진 양만큼 소화해낸다.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Fire drill”을 실시하면 그 어린아이들이 침착하게 줄을 지어 학교를 빠져나온다. 반복과 숙달로 체득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어느 장소에 가 봐도 잘 뒤져 보면 먼지 쌓인 ‘재난 대응 매뉴얼’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지니에게 소원을 빌 때도 최소한 램프는 문지르고 소원을 말해야 한다. 우리의 그 매뉴얼들은 적혀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초유의 힘을 가진 걸까.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라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나는 이 구절을 “무탈을 원하거든 위기를 대비하라.”라고 해석하고 싶다. 부품이 많은 기계는 단순한 것보다 고장이 잦은 법이다. 고도로 분화되고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재난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작금에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들을 단순히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관련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산더미 같은 매뉴얼만 쏟아내면 뭐하겠는가? 그 차곡차곡 쌓아둔 종이뭉치에 깔려 죽는 또 다른 안전 사고만 일어날 뿐이다. 사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에서, 병원에서, 지하철에서 불시에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우리의 잠들어 있는, 어쩌면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안전 감응 세포’를 깨워야 할 때이다. 지식인인 우리 대학생, 대학원생부터 변화해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