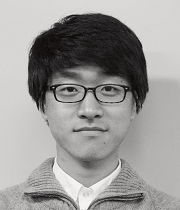
부대신문 기자는 일반적으로 한 주에 세 개에서 네 개의 기사를 맡는다. 그런데 종종 쓰는 기사 중 몇 개 기사의 주제가 서로 일맥상통하는 경우가 있다. A기사를 쓰다 보면 B기사에 적용이 될 것 같고, B기사를 쓰다 보면 A기사에 적용이 될 것 같은 식이다. 이번 주에 필자가 쓴 홍세화 전 진보신당 대표의 특강과 탐구면의 파업의 경제학은 바로 그런 관계였다.
홍세화 대표의 특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상위 20%의 사람이 80%의 사회적 부를 가진다는 ‘20대 80의 법칙’이었다. 그런데 참 신기하다.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80에 해당하는 사람이 20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을까? 필자가 몇 번의 선거를 보면서 늘 했던 질문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줄까’라는 것이었다. 강연을 들으며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홍세화 대표는 '20의 이데올
로기에 80이 지배당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결국 아무리 자신의 삶을 불평해도, 20이 강요하는 가치에 젖어 삶을 바꿔나가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렸다는 말이다. 자신의 ‘생각의 좌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파업의 경제학을 다룬 기사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도 같았다. 기성 언론들은 공장이 나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파업이 발생하기만 하면 ‘몇 천 억대의 손실이 일어났다’던가 ‘시민들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는다’라는 논리로 파업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이런 언론들의 주장으로 파업 자체를 혐오하는 여론이 형성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대로 매번 파업을 할 때마다 수천억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어떻게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또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면 대중교통 노동자들은 부당한 임금을 그저 참아야 할까?
프랑스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시민교육’ 과목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짐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국의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초등학생들은 그저 5개의 선택지 중 국민의 4가지 의무와 권리가 아닌 것 하나만 찾아내면 된다.
이번 주 취재를 하면서 필자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고 있다고 취재 수첩에 적고 싶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 반대로 채워질 뿐이었다. 우리 사회의 ‘생각의 좌표’는 있어야 할 곳의 반대편에 찍혀 있다는 것이 새삼스레 느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