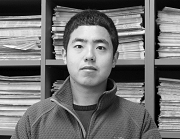
글을 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온전하게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고 소설을 쓸 용기가 생긴 건 무모하지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다. 그 책을 집어 들었을 때가 여름이었다. 그 여름은 하도 더워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때였다. 찬바람이 나오는 진리관 에어컨 아래에서 문장을 꾸역꾸역 씹어 삼켰다. 좁은 방과 한글문서의 빈 여백은 당시 재밌는 놀이터였다.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심사위원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소설이 무엇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으니 공부하겠다. 되도록 글이 길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글을 쓰고 난 뒤부터 줄곧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역시 소설이라 이름 붙기 위해선 읽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부끄럽지만, 숨을 데도 없는 것 같다.
형과 함께 갔던 소백산에서 돼지바위 옆에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돌아가도 도달할 것이며, 길은 이어져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경직(법학 4)
press@pu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