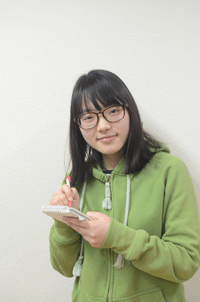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권리부터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달 27일은 이틀간 진행되는 제45대 총학생회와 단과대학(이하 단대)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첫 선거 날이었다. 새로운 단대 학생회장 선출을 성사시키려면 학생들의 선거율이 적어도 50%는 넘어야 한다. 그럼에도 27일 사회대 학생의 선거율은 20%를 채 넘지 못했고 사회대 학생회장이 나오지 못할 위기에 처할 뻔 했다. 어느 학과대표는 학생들에게 번거롭더라도 적극 참여할 것을 부탁했다.
필자는 이번호 문화면의 민중예술 관련 기사 취재를 하면서 70, 80년대 시민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직접선거를 지금의 우리들은 너무 가벼이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독재정권 아래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민중들은 총을 든 군부에 짓밟히면서도 민주주의를 외쳤다. 이토록 어렵게 얻어낸 직접선거임에도 지금의 대학생들은 그 권리마저 포기하려 하고 있다.
70, 80년대 민중예술은 일반 민중이 그리는 예술, 민중을 위해 존재하는 예술이었다. 더욱이 민중예술의 선두에서 민중을 이끌어온 것은 대학생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대학생들은 ‘나의 이 한 표가 결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품는 것 같다. 취재원인 우리학교 모 교수는 “무한 경쟁시장에서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한 대학생들은 정치적 이슈에는 침묵하거나 방관한다”고 꼬집었다. 정치와 우리 생활은 떼려야 뗄 수 없다. 가령 전기세금을 올린다는 법을 제정한다고 치면 대학 등록금도 오를지 모른다. 헌데도 눈앞의 이익만을 좇다보니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에는 정작 무관심하다.
정치인과 정당은 유권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공약에 반영하려 노력한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학생들은 자연스레 정당의 관심대상에 제외된다. 새 정부가 수립된 뒤 뒤늦게야 대학생들은 우리의 입장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비판을 쏟아낸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투표다.
최근 배인석 작가의 청와대 라이터 프로젝트도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배작가는 “시민들이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며 그저 비난만 하고 만다”고 비판했다. 올바른 정치를 펼치지 못하는 지도자층을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인 선거에 참여하는 효원인을 기대해본다.

